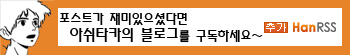인터내셔널 (The International, 2009)
괜찮은 다 아는 이야기
이 영화 <인터내셔널>은 역시 두 배우, 클라이브 오웬과 나오미 왓츠 때문에 보게 된 영화였다. 감독 이름은 미리 확인하지도
못할 정도로 별 다른 정보 없이 보게 되었는데, 감독은 다름아닌 <롤라 런>과 <향수>를 연출했던 톰 튀크베어 였다.
사실 감독이 누구인지 모르고 영화를 보게 된 드문 경우이긴 했으나 중간에 '혹시'하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도 있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죠).
사실 애초부터 그리 큰 기대를 했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럭저럭 볼 만한 영화였던 것 같다.
정부와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연루된 음모를 파해치는 주인공, 그 와중에 중간중간 밝혀지는 작은 반전들, 그리고 가미된 액션들.
2시간을 즐기기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이미 비슷한 영화들을 통해 너무 많이 보았던 이야기들을 모은 것 이상의 감흥은 없었으며,
결국 소스를 빌려온 영화들 이상은 보여주지 못했던 평범한 영화이기도 했다.

클라이브 오웬이 연기한 주인공 루이 셀린저는 인터폴 소속의 형사로 은행과 연관된 대규머 범죄조직의 음모를 파해치고 있으나,
워낙에 연관된 정부와 기업들이 많아 내부적으로도 협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셀린저를 돕는 인물이 바로 나오미 왓츠가 연기한
뉴욕의 보조검사 휘트먼이다.
영화의 대략적 줄거리라인은 이미 범죄 스릴러 혹은 액션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영화들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마치 또 하나의 다른 에피소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가지 영화의 잔상들이 엿보이는데, 옥상을 넘나들며 추격전을 펼치는 장면에서는 <본 얼티메이텀>으로 대표되는 '본 시리즈'가 연상되고, 거대 범죄조직을 상대로 제목처럼 '국제적인' 로케이션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첩보 장면들은 007 시리즈를 비롯한 이른바 '요원'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던 요소들이었으며, 이 영화가 후반부에 깊게 다루고 있는 메시지 측면은 <다크 나이트>를 절로 떠올리게 한다. 사실 이 같이 여러 영화들의 요소들이 비쳐지기는 하지만, 톰 튀크베어 감독은 비교적 이를 잘 버무린 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쉽게 말해 앞서 언급한 이런 영화들을 감상하지 않은 관객들이라면 (그런 관객들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미 본 이들이라도 그리 지루하지 않게 러닝타임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조직을 상대하는 '요원'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들과의 유별난 차이점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후반부에 삽입하고 있는 <다크 나이트>의 메시지는 이미 <다크 나이트>를 통해 완벽하게 구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이 영화에서는 분명 이것이 핵심은 아니었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짧지 않은 러닝타임을 통해 인물들의 동기나 연관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풀어내지 못한 것도 조금 아쉬운 점일 수 있겠다(역시 본 처럼 3부작으로 가야만 완벽한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첫 번째 장면은 박물관에서 벌어지는 총격 씬을 들 수 있겠는데, 독특한 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 장소의 장점을 100% 활용한 멋진 구성이었다. 뭐랄까 클라이브 오웬이 처음 이 공간에 들어서면서 한 번 주위를 쓰윽 둘러보는 장면서 부터, 왠지 이 장소가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했는데, 역시 장소를 완전히 초토화 시키는 액션 장면이 벌어지게 된다. 톰 튀크베어 감독은 이 원형구조를 액션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니 임팩트 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확실히 총격 액션 장면에서는 마이클 만이 항상 떠오를 수 밖에는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극중 클라이브 오웬과 아민-뮬러 스탈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다크 나이트>를 연상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시퀀스였다. 개인적으로는 이 둘의 대화 장면도 장면이었지만 이를 작은 틈 사이로 나오미 왓츠가 바라보는 시점이 인상적이었는데, 극 중에서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클라이브 오웬이 연기한 셀린저와 현실적인 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아민-뮬러 스탈이 연기한 웩슬러를 번갈아 보는 시선 연출은, 어쩌면 꼭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범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과 법으로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범죄에 한해서는 법을 초월해야만 제거할 수 있다는 현실의 가운데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케 하는 관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출이었다고 생각된다. 영화는 결국 엔딩 장면에서도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어떤 것이 결국 옳았는지 보다 과연 멈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담고 있기도 하다.

너무 익숙한 주제들을 다룬터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흥미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독의 매끄러운 연출과 뉴욕, 프랑스, 터키의 이스탄불, 베를린 등등 다양한 로케이션 장소, 특히 인상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들을 만나보는 재미도 쏠쏠했던 영화였다.
클라이브 오웬의 연기는 그리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바바리를 걸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칠드런 오브 맨>의 이미지가
너무도 겹쳐보였으며, 나오미 왓츠의 경우는 캐릭터 자체가 좀 심심한 캐릭터였던 것 같다(누군가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를 어서 다시 보고 싶다!). 아민-뮬러 스탈의 경우 <이스턴 프라미스>에서 보여주었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또 한 번 기대했으나 캐릭터 자체가 보스 역할이 아니라서 였는지, 이에는 못미치는 살짝 아쉬운 연기였다.
두 배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패스하기엔 아쉬움이 남는 영화겠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관객이라면 과감히 패스해도
될 듯 하다.
1. 인터폴 본부가 나오는 장면에서 잠시 남자 배우 한명이 대사 한마디와 함께 스쳐 지나가는데, 분명 벤 위쇼였다! 그래서 '엇! 벤 위쇼가 이 영화에 나온단 말이야?'하고 놀랐다가 단 몇 초 이후엔 등장하지 않길래 혹시나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했었는데, 엔딩 크래딧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벤 위쇼가 맞았다. 나중에 이 영화가 <향수>를 연출한 톰 튀크베어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야 벤 위쇼가 까메오 출연한 것에 '이유'를 수긍할 수 있었다(혼자 알아보고 혼자 좋아했다는 ㅎ)
2. 한 때 제임스 본드 후보로 거론되었던 클라이브 오웬은 이 영화를 통해 어느 정도 비슷한 캐릭터를 연기한 것 같네요 ㅎ
3. 감독인 톰 튀크베어는 음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봉 영화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 6회 씨네아트 블로거 정기 상영회 후보작 투표해주세요~ (6) | 2009.03.11 |
|---|---|
| 왓치맨 _ 히어로에 빗댄 정치와 권력에 대한 담론 (26) | 2009.03.09 |
| 말리와 나 _ 반려동물을 통해 보는 인생 (3) | 2009.02.26 |
| 더 레슬러 _ 한계와 가치있는 것들에 대한 찬사 (9) | 2009.02.24 |
| 2009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 광고 포스터 (10) | 2009.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