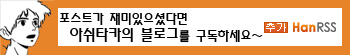아버지의 훈장 (The Medal of Honor, 2009)
시대의 회환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보기 위해 갔던 이번 1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 보다 먼저 보게 된 영화는 루마니아 영화 '아버지의 훈장'이었다. 영화제가 두근거리는 이유는 좋아하는 감독의 신작을 만나는 것 외에 모르는 감독과 작품을 감으로만 선택하여 즐기게 되는 '긴장감' 때문이기도 한데, 내게 있어 칼린 피터 네쳐의 영화 '아버지의 훈장'은 그런 종류의 미지의 영화였다.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시놉시스를 보고는 그냥 노인이 주연한 코믹과 감동의 드라마 일 줄 알았는데, 막상 본 영화는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겪었던 시대와 그로 인해 벌어질 수 밖에는 없었던 슬픈 자화상을 아주 개인화한 사건을 통해 풀어낸 '좋은 영화'였다.
변변한 직업 없이 연금으로 하루하루를 부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인 '이온'. 집 관리비가 밀려서 주인을 피해다니고, 난방이 안되 방안에서도 옷을 껴입고 있어야 하지만 고칠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내는 남편과 말조차 섞지 않은 지 한참이 된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영문을 알 수 없는 훈장 하나가 이온에게 수여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고, 이온은 자신이 왜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쓰면서 이야기는 한 발 더 나아가기 시작한다.
영화 속 이온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보통 이런 줄거리의 주인공이라면 무언가 '생색'을 낼 수 있는, 넝쿨째 굴러온 좋은 기회를 그저 놓치지 않으려 바로 움켜쥐려고만 할 텐데, 이온은 도대체 자신이 왜 훈장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유를 집요하게 찾아내려 애쓴다. 그 과정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지만 중요한 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온은 (적어도) 스스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게 되고, 그제서야 이 훈장을 떳떳히 자랑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대통령에게까지 초대를 받게 되면서 그의 이런 자랑은 그의 주변 사람들과 한 동안 말 한마디 않고 지냈던 아들에게까지 퍼지게 된다.
루마니아가 겪었던 역사와 이로 인한 현재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영화는 나처럼 정보가 적은 이가 보아도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왜 '이온'은 그럴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떠올려 보게 한다. 왜 이온은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밀고하여 감옥에 보낼 수 밖에는 없었으며, 그로 인해 가족들은 한 동안 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소통을 닫고 살아야 했으며, 왜 훈장이라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둘 수 밖에는 없었는지를 말이다.

ⓒ HI Film Productions. All rights
reserved
영화는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몰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순간에 무너트리고 만다. 그 무너지는 순간은 곧 이온의 좌절의 순간이며, 이 좌절은 허무함이라기 보다는 '회환'에 가까운 감정이다. 그래서 별다른 장치 없이 드디어 만난 아들 앞에서 나서기를 주저하고, 주변 인물들이 모두 모인 즐거운 식탁 앞에서 이들의 대화가 단순한 소음으로 느껴질 정도로, 순간적으로 자신의 회환에 휩싸이는 마지막 시퀀스는 감정적으로 압도적이다. 루마니아가 겪는 시대를 떠올리지 못했던 이들이라도, 그래서 시종일관 이온의 행동들을 그저 한 노인이 겪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들로 보았던 이들 조차도, 마지막 이온의 울컥함에는 공감할 수 밖에는 없다. 그 것이 이 영화의 힘이다. 마치 매일 웃으며 보던 TV 시트콤의 어느 장면에서 갑자기 울컥하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훈장'은 좋은 엔딩을 갖고 있다.
1. 사실 큰 기대 없이 그 시간 대의 영화 가운데 시놉시스만 보고 고른 영화였는데, 대 만족이었습니다.
2. 엔딩 크래딧에 흐르던 노래도 좋았어요. 마치 '그르바비차'의 엔딩에 흐르던 '사라예보, 내 사랑' 과 같은 느낌.




글 / 아쉬타카
(www.realfolkblues.co.kr)
본문에 사용된 모든 스틸컷/포스터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모든 이미지의 권리는 HI Film Productions에
있습니다.
'개봉 영화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녀 _ 계급사회에 대한 쌍방향적 비아냥 (1) | 2010.05.16 |
|---|---|
| 하하하 _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철학적 놀이 (8) | 2010.05.10 |
| 브라더스 _ 토비 맥과이어마저 변화시킨 그 것 (3) | 2010.05.06 |
| 아이언 맨 2 _ 이젠 (슬슬) 어벤저스가 보고 싶다 (8) | 2010.05.04 |
| 킥애스 _ 히어로물의 또 다른 진화론 (12) | 201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