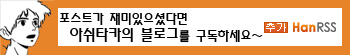소스 코드 (Source Code, 2011)
제목이 8분이 아니라 소스코드인 이유
'더 문 (The Moon, 2009)'을 연출했던 던칸 존스의 신작 '소스 코드'를 보았다. 확실히 이 영화를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이크 질렌할이나 베라 파미가가 아니라 던칸 존스였다. '더 문'을 통해 보여준 그의 재능과 SF적인 아이디어를 감성적으로 영화에 녹여내는 그의 방식은, '소스 코드 (Source Code)'라는 제목과 함께 또 한 번 비슷한 경험을 선사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 영화를 홍보하는 방식에는 '인셉션 (Inception)'이 항상 함께 했었는데, 그 의도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셉션'을 거론해도 될 만한 작품이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은 꿈 속의 꿈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 꿈의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확장시켰지만 결국 그 안에는 주인공 코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매우 감성적인 러브 스토리이자 드라마였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소스 코드' 역시 평행우주론이라는 세계관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SF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드라마에 가까운 접근법으로 풀어낸 같은 방법론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 The Mark Gordon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영화는 시카고행 기차안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 주인공 콜터 (제이크 질렌할)는 열차 안에 있지만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심지어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 그리고 곧 열차는 폭발하고 또 한 번 영문을 알 수 없는 공간에서 한 여성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는 열차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다시 열차로 돌아가야 하며, 8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들은 채 다시 열차 속 시공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소스 코드'의 설정은 사실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시간여행이나 평행우주에 관해 그렸던 영화들에서 볼 수 있었던 익숙한 설정들이 자주 등장하며, 꼭 이 설정만이 아니더라도 큐브에 갇혀 만져지지 않는 다른 이의 메시지에 의지하게 된다는 점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특히 같은 시작점의 8분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은 빌 머레이 주연의 '사랑의 블랙홀 (Groundhog Day, 1993)'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놓인 구체적인 상황만 다를 뿐 극중 제이크 질렌할이 처한 전체적인 상황은 빌 머레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익숙한 재료들과 설정들을 가지고 요리했지만, 던칸 존스의 이 완성된 요리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해보자면 균형이 아닐까 싶다.

ⓒ The Mark Gordon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소스 코드'에는 더 강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줄기가 여럿 존재한다. 영문도 모른 채 소스 코드 속에서 '션'으로서 세상을 구해야만 하는 콜터의 이야기, 아프칸에서 헬기 조종을 했던 군인으로서 콜터의 이야기, 소스 코드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8분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크리스티나 (미셸 모나한)를 비롯한 사람들의 이야기 등.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스 코드'는 이들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 끝까지가는 방법 대신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가지 이야기에 (설령 그것이 오버스럽더라도) 몰두해서 극한까지 몰아가는 편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요소를 전부 껴안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린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던칸 존스의 '소스 코드'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아쉬움 보다는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다. 상황에 바로 놓여져버린 주인공 콜터의 개인사는 아버지와의 짧은 인연 (정말 짧은) 정도만 묘사되고 있는데, 이 영화가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짧은 아버지와의 연관관계 만으로도 후반부 콜터라는 캐릭터를 설명하는데에 아주 큰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와 아버지 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고, 콜터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화 한통으로 이런 여백을 모두 담아냈다는 것은 분명 이 작품의 숨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다른 SF영화였다면 아마도 가장 큰 이슈가 되었을 소스 코드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소재 정도로만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장황한 설명이나 상황 묘사 없이 '평행우주론'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 역시 이 영화에 장점이라 하겠다.

ⓒ The Mark Gordon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아마도 군의 주도로 진행되는 소스 코드 프로젝트의 배경에 깔린 음모라던지, 이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암암리에 진행되는 일들, 더 나아가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다면 D.J.카루소 감독의 '이글 아이 (Eagle Eye, 2008)' 같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런 시스템과 배경에 관한 이야기의 개입은 소극적으로 하면서도 영화를 보는 이로 하여금 이런 상상을 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딱 그 정도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그 여지와 소스 코드 프로젝트를 대변하는 것은 베라 파미가가 연기한 '굿 윈'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 캐릭터의 묘한 비중이 '소스 코드'를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굿 윈은 제프리 라이트가 연기한 '닥터 러틀리지'와 주인공 콜터 사이에 위치한 인물로서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이 연결고리의 훌륭함이 (캐릭터나 베라 파미가의 연기 모두) 이 영화가 더 매력적이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갖게 했다고 할 수 있겠다.

ⓒ The Mark Gordon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의 제목은 '소스 코드'보다는 오히려 '8분'이라고 하는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인 던칸 존스가 왜 '소스 코드'라고 제목을 가져갔을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독의 전작 '더 문'을 떠올려 봤을 때, 이 작품이 진정한 SF영화로 인정 받는 이유는 SF적 설정이나 세계관을 부각시켜 드러내지 않고 완벽하게 녹여낸 채, 그 토대에서 자유롭게 다른 얘기를 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소스 코드'는 평행우주라는 세계관을 그 중심에 대놓고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기반 위에 완전히 녹아든 캐릭터와 이야기를 통해 드라마 같은 SF영화를 만들어 냈기에 '더 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평행우주가 도대체 뭐야?' '그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갖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과연 다른 평행우주에 존재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떠올려보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SF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 물론 이 영화가 과학적으로 완벽한 영화였는가에 대해서는 작은 의문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도 세계관을 완벽하게 녹여냈다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SF영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2. 저는 왜 닥터 러틀리지 역할을 맡은 제프리 라이트를 영화를 보는 내내 아이스 큐브로 생각했던 걸까요. 심지어 제프리 라이트가 이전에 출연한 작품들 가운데서도 아이스 큐브라고 생각하며 봤던 작품이 많네요 -_-;;
3. 결국 가장 불쌍한건 '숀'. 숀은 누가 챙겨주나요 ㅠ
'개봉 영화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상의 모든 계절 _ 메리를 둘러 싼 삶의 온도 (3) | 2011.05.16 |
|---|---|
| 파란만장 _ 박찬욱과 어어부프로젝트의 콜라보레이션 (0) | 2011.05.11 |
| 토르 _ 대서사와 셰익스피어를 입은 마블 히어로 (13) | 2011.05.02 |
| 마셰티 _ 일부러 그 수준으로 만든 영화 (2) | 2011.04.26 |
| 눈물나는 그 장면 #7 _ 타이타닉 (7) | 2011.04.19 |